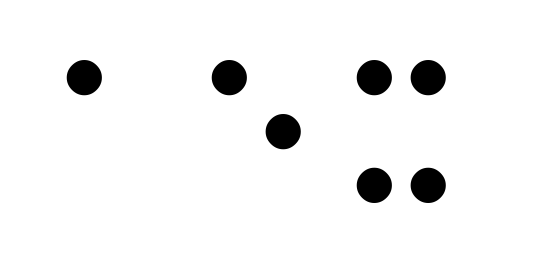[스포주의]
권해효의 김새벽에 대한 사랑은 외도라는 도덕적 굴레를 떠나서 빈약하고 부실하다. 그녀가 일을 그만 두자 마자 새로 사람을 구하고, 돌아온 그녀와의 생활은 채 한달을 넘기지 못한다. 부실한 사랑은 권해효가 가진 위선의 한 부분이다. 그의 위선은 영화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우연히 한번 만났던 택시 기사도 알아볼 정도의 김민희를 권해효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의 직업을 출판사를 운영하는 문학인으로 설정한것도, 배경으로 보이는 수많은 책들과 클래식 음반들도 모두 지식인의 위선을 강조하는 장치이다.
영화 중반부의 권해효와 김민희의 철학토론 장면은 캐릭터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다. 이것이 만약 감독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었다면 영화는 심히 촌스러워졌겠으나,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토론은 철학의 흔한 인식론적 주제에 대한 것인데, 권해효는 대강 비트겐슈타인이 연상되는 입장에서 말로 표현할수는 없으나 진리를 담고 있는 실체를, 반면 김민희는 실체 보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이 토론의 내용 자체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이 토론을 통해 표현되는 인물의 성격이다.
권해효는 여기서 현학적인 이야기를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정체를 자신도 정확히 모르는 공허한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김민희의 주장은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택시안에서의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영화의 방점이 위선이라는 주제에 찍혀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위선적인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여러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담담히 묘사하는 것에 그친다. 위선적이라고는 하지만 권해효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동정심이 가고, 포용할수 있는 불완전함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아무래도 이 영화는 홍상수 감독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것이 진솔했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으나 의미 있는 시도임에는 분명해 보인다.